비평을 읽는 것(읽는 것)

Archive 10(미술)비평을 읽는( 하는)것I곽 영빈I칼럼 이 글의 제목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그 많은 괄호는 불필요한 건 아닐까?문은 쉽지 않으면 안 되고, 독자인 내가 한번에 이해되지 않으면”쓸데없이 어렵다”것이 분명하며 부드러운 스크롤을 방해하는 모든”명징”과 “직물”이 가차 없이 단죄되는 디지털 세계에서이다.대체로”비평”에 관한 글 같지만 이 복잡한 제목이 비평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왜 비평이 읽히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자충 수가 아닐까?더욱 쉽게 쓴 것에 왜 굳이 벽을 쌓는 것?결론의 일부를 미리 잘 나타내어 두면 쉽고 어려운 글이 아닌 좋지 않은 글이 있을 뿐이다.이 두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내가 수업이나 강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이 명료하고 근원적 공리는 이른바”예술 작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직접 만난 작가가 “전회의 작품은 아주 쉬웠어요!”과 경탄하거나”아주 간단하고 충격에 빠져”이라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온다”라는 영화나 음악을 반복해서 보고 듣는 사람은 없다.간단하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고 아주 좋아해서 반복한다.그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뿐이다.그래서 비평은 쉽지 않으면 안 되잖아?이 질문이 변주될 때마다 나는 그렇게 하면”기억에 남을 비평”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한다.(이 글의 독자 대부분이 한국어 사용자인 외국어로 적힌 글을 떠올리기 어렵지 않을 것이니)이는 “한국어로 쓰여진/ 읽은 글 속에 그 글의 결론과 독해에 대한 동의는 독립 여전히 기억하는 새삼 되씹게 좋은 비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지난해 12월 4회 만에 처음으로 단독 수상자를 배출한 “SeMA-하나 평론 상”을 2015년에 수상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위에 공유한 이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주신 분들은(의외로) 많지 않았다.”해방 이후 그런 문은 없었다”라는 과장이나,”나야말로 그런 글을 쓰고 온 드문 장본인”이라는 나르시시즘적 착각을 차분하게 솎아 내면”비평(가)의 죽음”이라는 소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시”주례사 비평”이나 “현학적 글쓰기” 같은 공허한 말 풍선에 포위되거나”전업 비평가로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발표 지면의 부족과 비현실적 원고료”라는”구조적 현실”에 대한 연연하지 않는 규탄을 발견할 뿐이다.물론 지난해 1년간만 전시 예산은 13억이지만, 도록에 포함되는 글의 예산은 30만원이니까 이해하고 달라는 국립 기관 전시 큐레이터의 청탁을 거절하거나 500만원 규모의 전시에 50만원의 비평비를 책정한 예산 계획 신청서를 심의하기도 하고 위에서 언급된 “SeMA-하나 평론 상”과 온라인 플랫폼에 따른 다양한 미디어와 콜렉티브의 결성을 일종의 “희망”이나 “대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접할 때도 있다.그러나 아무리 물질적 지원이 개선되고 새로운 수상자가 배출된 매체가 늘어나더라도 그 수많은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이 좋은 글인지 아무도 모르고 지식 인간의 험담 속에서 증발하거나 여전히 학계에서도 물어뜯는 그린버그와 리화도의 글처럼 인용는커녕 아예 이야깃거리도 안 된다는 뜻에서 결국 읽지 않았다면” 쉽게 글”에 대한 무책임한 강박을 포함하고”(미술)비평을 읽을 수(시킨)것”은 무의미한 공회전은 아닐까?이런 의미에서 다음의 제안을 공론화하려고 한다.판단의 권위를 새로운 특정 기관이나 인사에 기탁 또는 위임하지 않지만”인기 투표”의 위험을 배제한 뜻을 모아 단순 미술 애호가에서 기관장에 이르는 미술인들이 “올해의 미술 비평문 톱 3″를 무기명으로 선정/투고한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에 집계하는 연말에 공유하는 것이다.거기서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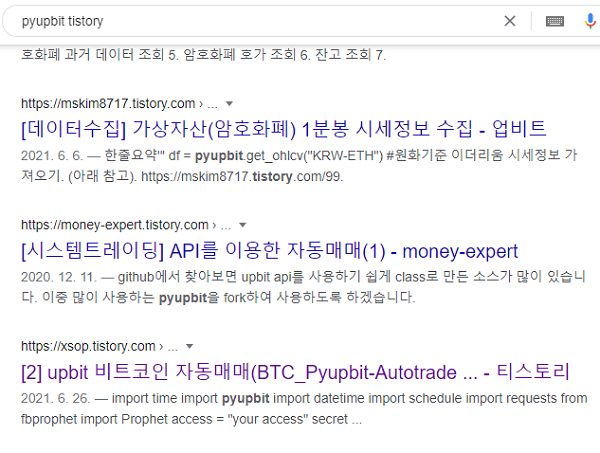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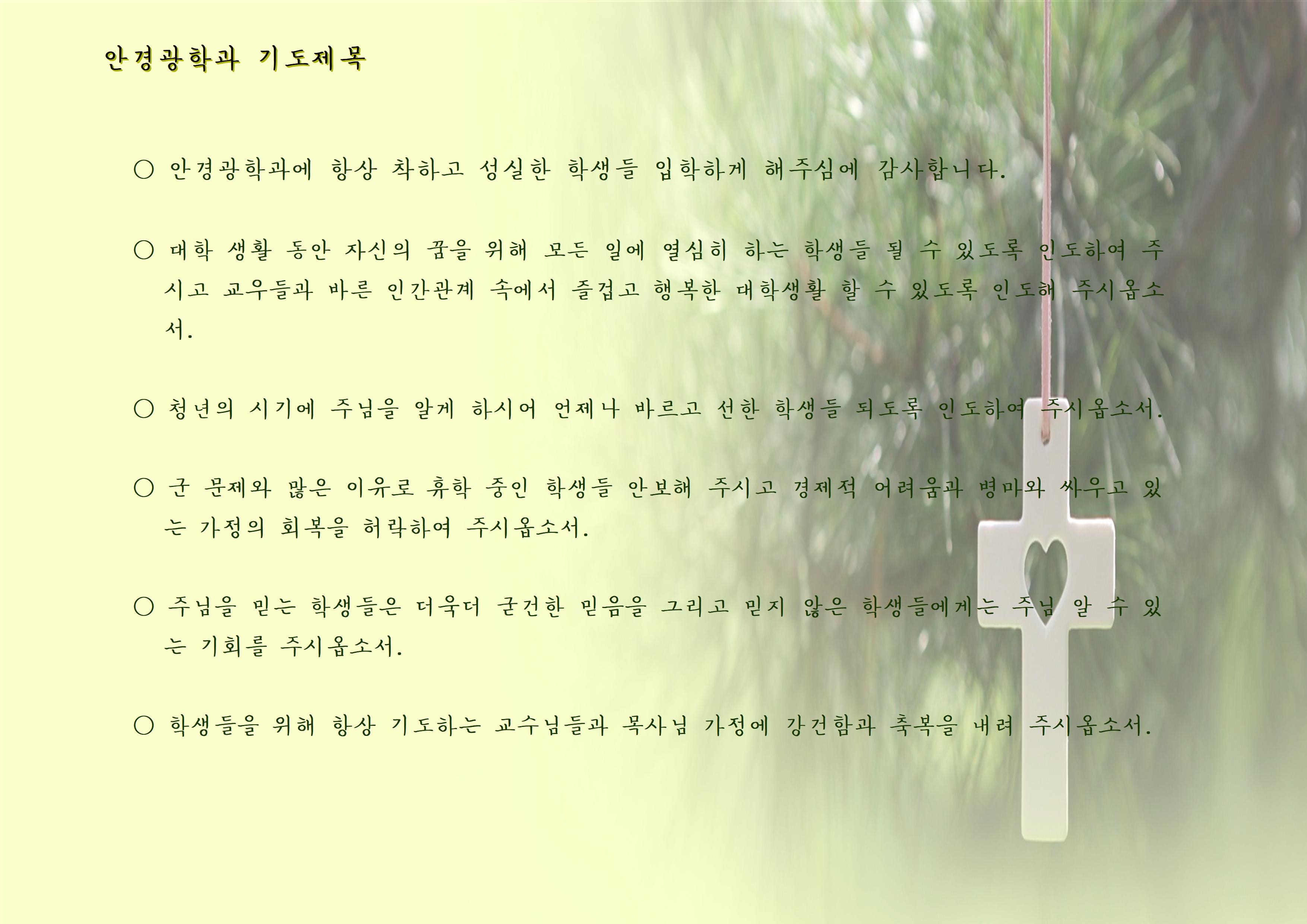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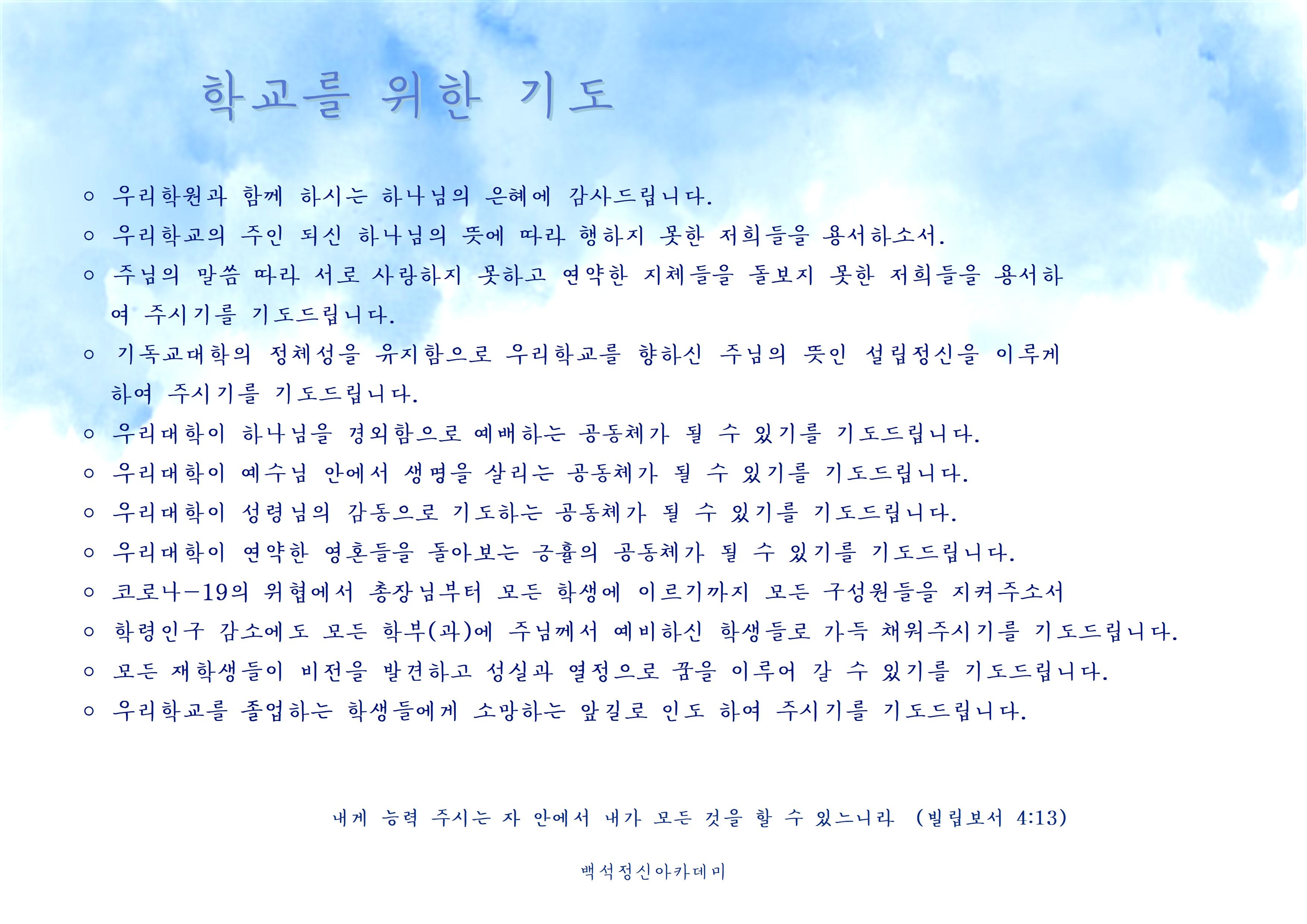
![[책] 2255 :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책] 2255 :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https://non.sobaekmnc.kr/wp-content/plugins/contextual-related-posts/default.png)

.png?type=w800)
